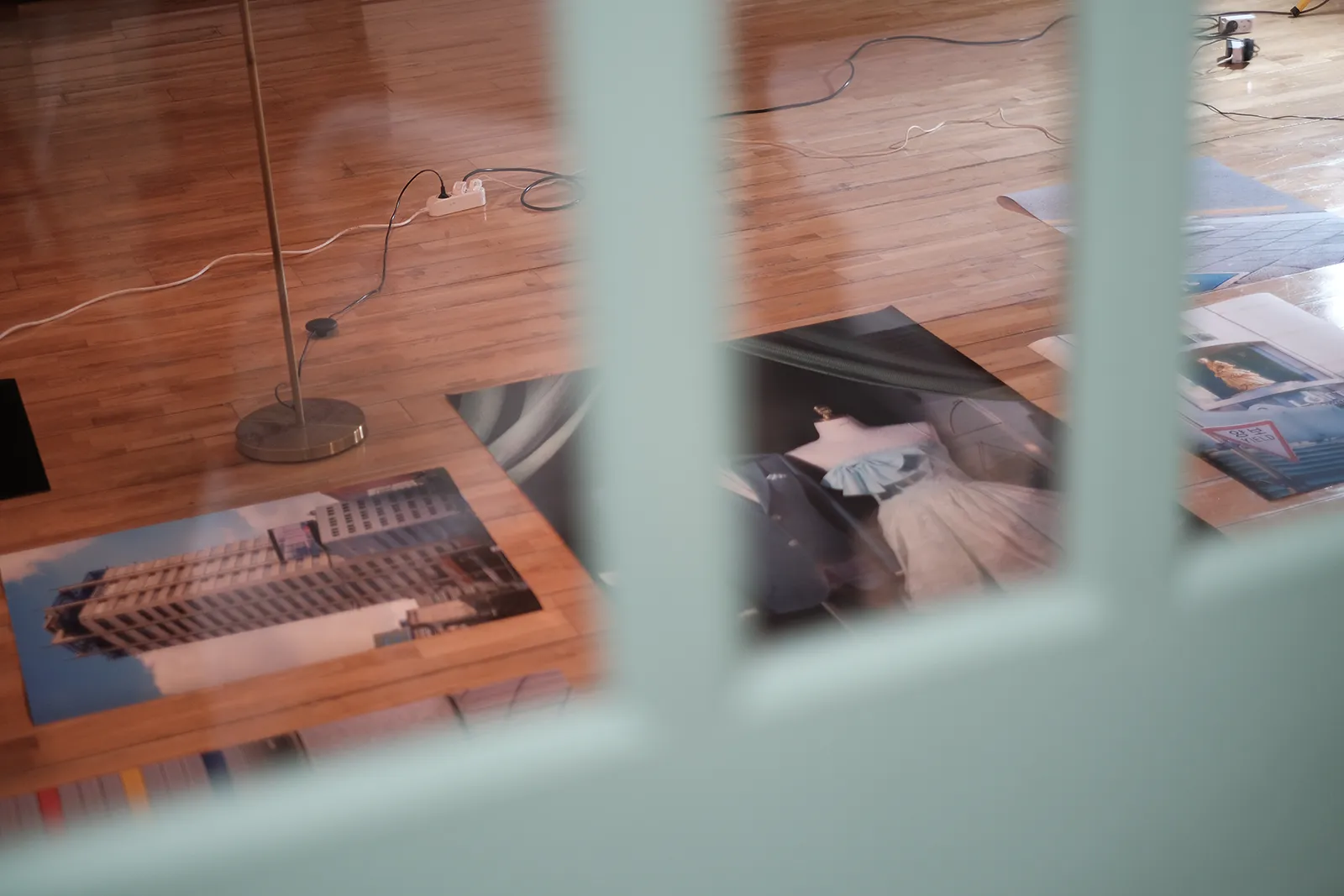가상과 현실의 접점(接點)
손님은 왕이다(The Customer Is Always Right, 2006)
오기현 감독, 성지루(안창진)·명계남(손님 김양길)·성현아(전연옥)·이선균(이장길) 출연.
나의 일거수 일투족은 모두 허구의 세계에서 기획되어 있는 행동들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하, R이라는 존재는 어느 소설가에 의해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나, R이 지금, 너 J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마저도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소설가에 의해 씌어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어. 나는 너에게 섹스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너는 회피한다, 이런 것도 나에게는 너무나 재미있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허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알 수 없는 사건들이라고 생각 돼. 나는 이따금 내가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해 두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의 소설이 되리라는 생각이들이다.(…) 물론 그런 유형의 소설이 나오면 무식한 독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지. 어느 시대든지 참된 소설의 독자는 언제나 무식하게 마련이지.
― 하일지, 『경마장 가는 길』, 민음사, 1990, 218~219쪽.

조정래(서경대 국문학과 교수)는 논문 「1990년대 한국 소설의 영상화 연구 ― 이미지와 가상현실」(1999)에서 1990년대 작가들이 “가상현실을 하나의 상상 세계로 격상시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가상현실이란 “논리적으로 혹은 공상적으로 만들어 낸 세계이므로, 거기에는 현실의 다양하고 총체적인 구조적 관계가 들어갈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허구(虛構)와 구분된다고 한다. 그 예로 “현상만이 문제가 될 뿐”인 김영하의 「흡혈귀」나 “폭력적 세계를 지향”하는 백민석의 『목화밭 엽기전』 등을 든다.
그렇다면 2000년대 한국소설은? 여전히 “서사성을 회복하는 길”은 외면당하고 있다. 그 대신 캔버스와 피사체의 경계를, 스크린 안과 상영관의 경계를, 재현과 현상,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살짝 지워버렸다. 이 악동 이레이저(eraser)는 얄밉게 웃으면서 말한다. “이래도 현실을 외면한다고, 왜곡한다고, 호도한다고, 도피한다고 비난할 거야?” 지금까지 현대 예술에 “현실의 맥락”이 없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2000년대 한국소설의 일관된 진화로 인해 다소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짬짜면 같은 작품이 득세하다니…”와 같은 탄식과 깎아내리기 외에는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작년 여름, 내 조카1호는 파리가 잔뜩 붙은 끈끈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파리지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대학살>이나 <독재자의 공감각> 같은 제목이 아닌 게 아쉬웠지만 조카1호는 여섯 살일 뿐이다. 어쨌거나, 조카가 제목을 붙인 순간 파리 끈끈이는 오브제(objet)가 되었다. 변기로 <샘(泉)>이라고 우긴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이나 다다이스트(dadaist)가 별것인가. 그리고 저녁이 되자, 파리 끈끈이를 잘라다가 일기장 한쪽에 붙이고 텔레비전 앞에서 웃는 자기 얼굴을 커다랗게 그렸다. 제목은 <파리지옥, 수현천국>이란다. 조카1호는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심했고 불과 여섯 살에 초현실주의 작가가 되었다. 천재가 아니고서야. ― 다음날 담임선생님은 ‘조카1호에게 가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내 조카는 여전히 투니버스를 즐겨보는 여섯 살짜리 아이다. 예일대학 순수미술학부로 진학시키고 싶지만 어려울 것이다. 작품 <파리지옥, 수현천국>은 창작자가 사고를 객관화한 결과물이 아닌 탓에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기현 감독의 영화 《손님은 왕이다》에서 드러나는 함의도 어쩌면 <파리지옥, 수현천국>과 비슷한 층위일지 모르겠다. 실제로 ‘Film2’와 인터뷰에서 오기현 감독은 “인물이 걸어 나와 현실과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내 감상과 다소 동떨어진 답안을 이야기했다.
영화 《손님은 왕이다》는 꼭 한번 볼만하다. 비록 “명계남에 의한, 명계남을 위한, 명계남의 영화”라는 빈축도 있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영화다. 그것은 명계남에 의해서도 명계남을 위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지루한 스릴러나 단순 소품으로 분류된 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상할 따름이다.
(애초에 성지루 배우를 주목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현실과 가상의 접점(接點)에 있는 ‘명계남’을 주목해야 한다. 영화 속에는 세 명의 명계남이 살고 있다. 그들은 “현실의 명계남”과 “영화배우(광대) 명계남”과 “명계남을 연기하는 명계남(김양길)”이다. 그 중 “영화배우 명계남”은 “현실의 명계남”과 “명계남을 연기하는 명계남” 사이를 관통하는 인물이다. 즉, 《손님은 왕이다》 속의 주인공인 “명계남을 연기하는 명계남”은 현실과 가상 사이의 창(窓)이다. 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비디오 클립으로 밀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상학적 문제가 발생한다. 작품 속의 인물(김양길)이 배우 명계남을 연기하지만 그는 이미 명계남이다. 다시 말하자면, 의식이 대상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同一)하므로 ‘자기지시(自己指示)’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가령 대학에는 괴담에 가까운 시험 응시 후기들이 존재하는데, ㅇ대학의 ㄱ교수님은 문학개론 시험에 “시(詩)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낸다. 한 학생은 “시는 시다”라는 답안을 제출했다. 그는 A+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동어반복과 자기지시는 논리학적인 귀결이다. 관객은 “명계남을 연기하는 명계남”과 “영화배우 명계남”과 “현실의 명계남”이 모두 하나를 지시하며, 동시에 ‘자기부정’과 ‘자기지시’를 번복(飜覆)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다(혹은 “명계남을 위한 영화”라고 비판한다). 명계남은 하나인가, 둘인가, 셋인가… 무한 복제되는가. 이것이 ‘르네 마그리트(Ren Magritte)’의 작품과 유사한 부분이다.
이런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은 똑똑하다. 우리가 본 건 결국 영화일 뿐이잖아. 이 질문에 다다(dadaism)의 캐치프레이즈가 도움이 될 것이다. ― “예술은 죽었다. 예술이여 영원 하라.” 파괴는 역설적이게도 무한을 의미한다.
《손님은 왕이다》의 형식은 메타픽션(meta-fiction)의 일종이다. 소설에서 메타픽션은 “픽션과 리얼리티와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가공물로서의 그 위상에 끊임없이 자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기법”으로 정의된다. 비록 텍스트 창작 과정의 자의식은 드러내지 않지만 자기를 반영하는 작품은 세계에 대해 의심과 회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끊임없이 제공한다. 그래서 “영화배우 명계남”과 “명계남을 연기하는 명계남” 사이의 상충은 시선을 끈다.
이 거친 감상은 누군가의 이해나 설득을 바라고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납득시킬 자신이 없다. 평소에도 현학적인 글을 참아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마그리트의 좋은 말씀을 전해야겠다. ― “상징적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시적 요소와 이미지의 신비함을 간과하게 된다. 아마도 이러한 신비함을 감지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떨쳐 버리고 싶어 할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음으로써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만약 신비함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할 것이다. 다르게 묻게 될 것이다.” ― 그러니 거부를 거부하고 직접 영화를 보자.
어쩌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지만, 성지루와 성현아, 명계남과 이선균이 만들어내는 모순과 역설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것은 메타픽션 소설들이 자주 취하고 있는, 관습적이라고 할 수 있는 딜레마를 상기시킨다. 또한 파괴와 영원이라는 순환구조에 근거하여 ‘명계남-성현아·성지루-이선균’이라는 도식을 보여준다. 이선균의 “안 선생과 연옥 씨의 연기는 계획대로 가네? 앞으로 쭈-욱! 그자?”라는 대사가 슬픈 이유는, 현실 속의 주인은 결코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 속 명계남이 “마술사는 진실의 가면을 쓴 환상을 보여드리지만 저는 환상의 가면을 쓴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장담하며 스크린에서 걸어 나온다. 그는 당신에게 여전히 손님이다. “환상의 가면을 쓴 진실”은 영원한 ‘숙주-기생 관계’의 구조적인 모순일까? 당신에겐 무엇을 보여줬나. 온전히 전하기 까다롭겠지만 말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