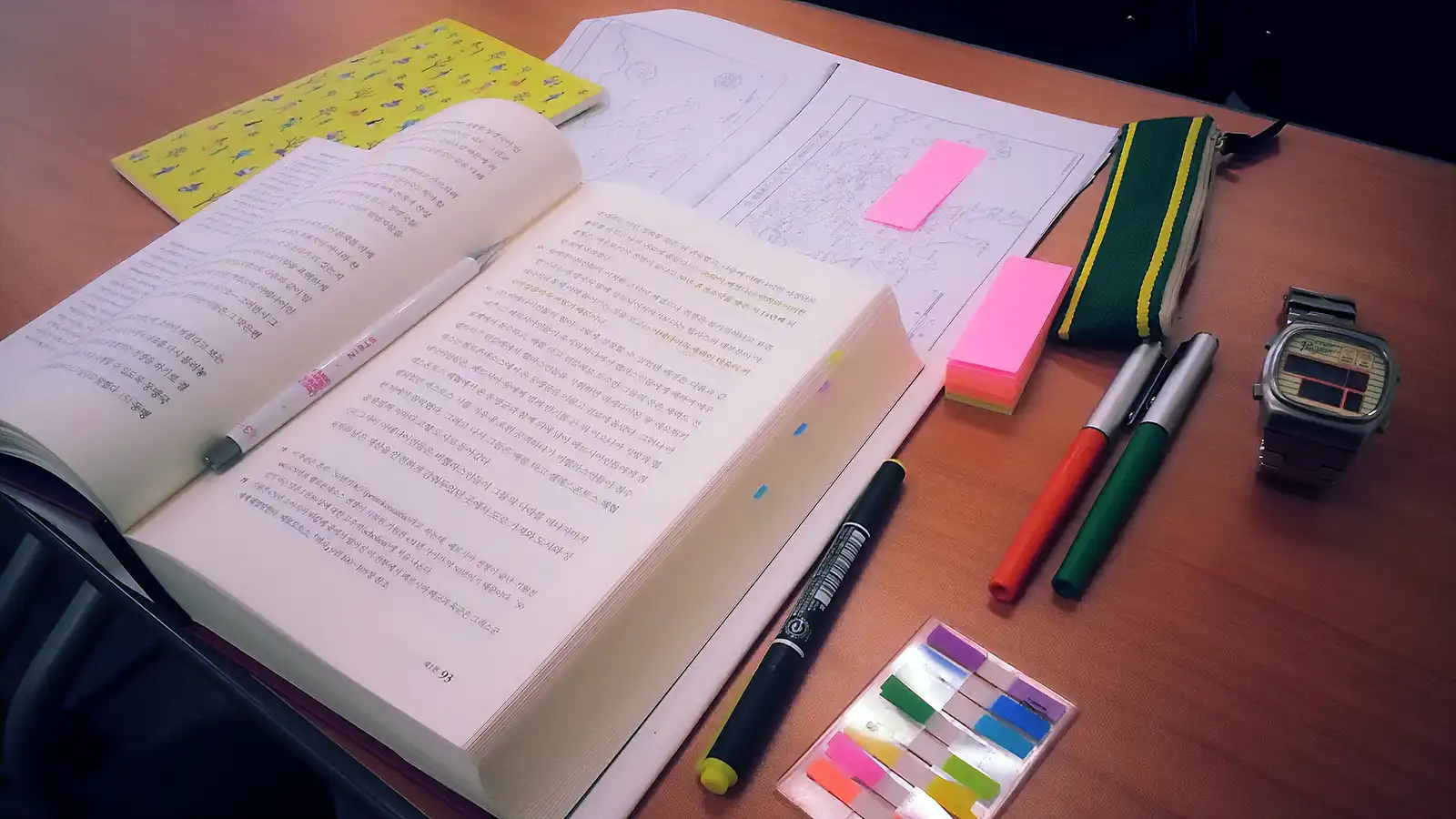가로수 그늘은 여기에서 끝난다.
“자외선은 상처의 주적이에요.”라고 말하던 피부과 의사 선생님의 엄중한 표정이 떠올랐다. 남쪽에는 있는 강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지만 볕은 아직 건재하다. 강물이 삼키지 못한 자외선 편린이라도 주적 잔당 정도는 족히 될 듯 보인다.
열흘가량 매달린 일이 끝났다.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다. 최종 파일을 클라우드의 깊은 골짜기에 밀어 넣고 나니 뭐가 불쑥 그리워진다. 중학교 시절에 수업을 마치고 자주 들르던 경양식집 미네르바의 3층 창문으로 내려다보던 거리 한편에서 S가 손을 흔들며 폴짝거리던 모습, 밤새 채팅을 하고 새벽 다섯 시에 만나 목욕탕에 가기로 약속했지만 스륵 잠들어버려서 동이 틀 때까지 내 방 유리창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다가 우리 부모님께 들켜 달아났다던 P의 절반쯤 울던 표정, 원인 모를 어지럼증이 찾아와 여러 달 방 안에 누워 물 위를 떠다니고 있을 때 자꾸 겁이 나서 닫지 못한 문 너머로 보이던 무화과나무와 그 초록 무성함, 하나뿐인 숟가락으로 내 입에 떠넣어 준 아이스크림을 앞니로 긁어 먹어야 할지 입술로 끌어 먹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절반쯤 도로 내놓은 순간의 난감함과 혀에 엉킨 끈적임, 뭐 이런 것들이 낮잠에 딸린 꿈처럼 이어졌다. 그래도 이건 그냥, 일을 앓고 나서 으레 찾아오는 후유증이 분명하다. 나를 누르고 있던 고임돌 하나가 줄어든 탓에 몇 센티미터쯤 땅에서 발이 떠오른 것에 불과하다.
더는 나아갈 수 없는 빛의 길을 등지고 나무 그림자를 되밟아 집으로 향한다. 빈집은 더 소란스럽지만, 거기에는 미지의 것으로 영원히 종결된 당신이 있다. 안전한 그늘 속에서 바라보는 당신의 빛은 마냥 따뜻해 보여서 자꾸 빨려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