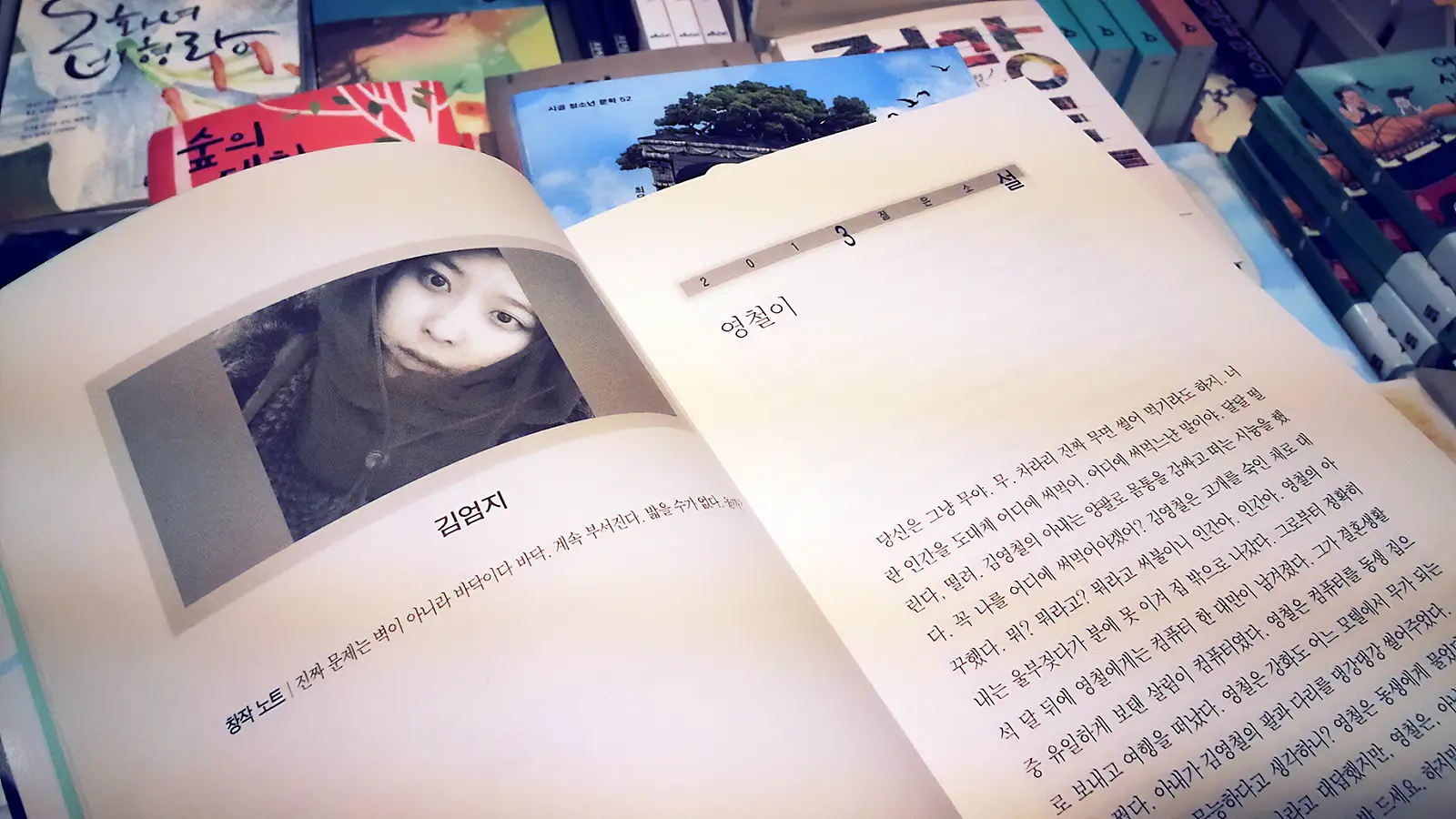책을 무더기로 구경해야겠다는 형의 고집에 못 이겨 아침 여덟 시부터 부지런을 떨었다. 평소 나라면 한창 잘 시간인데도 조카들은 군말 없이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어차피 책은 당장 손에 쥐고 읽을 단 한 권만 있으면 될 텐데 거기까지 왜,라고 강변해도 소용없었다.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몇 분 서 있는 것만으로도 혼이 빠졌다. 대략 4500평 규모의 전시장을 가득 채운 책, 다른 곳에서 구경하기 힘든 해외 도서. 다채로운 부스 사이를 흐르면서 여유롭게 글자를 곱씹는 사람들과 긍지 가득한 표정으로 매대 위 책에 관해 설명을 곁들이는 사람들… 같은 건 없었다. 그래도 나 혼자 순진한 기대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았다. 곁을 지나는 사람들도 비슷한 불만을 늘어놓았다. 서울국제도서전은 대대형 서점과 다르지 않았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전신은 1954년 서울도서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뭘 계승하고 뭘 발전시켰는지 알 수 없었다. 소위 ‘국제도서’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살았다는 “예쁜 붕어 두 마리” 정도고, 어린이 학습지 장사꾼이 목 좋은 곳에서 주인행세를 하고 있었다. 이 장사꾼들은 수완만큼이나 인심도 후해서 온갖 기념품을 무료로 나눠줬다. 공짜는 안 받으면 손해니까(정말 대단한 마케팅 구호다), 기념품을 얻으려는 아이와 부모님(대부분 어머니)으로 전시장 중심 통로가 꽉 막혔다. 다 같이 한 칸씩 세 들어 전시하는 처지에 ‘(주)기탄교육’ 직원들은 앰프까지 연결한 마이크로 쉼 없이 떠들었다. 정확한 통계가 있을 리 없겠지만 입장객 중 최소 8할은 조기교육 교재를 고르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렸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책 도떼기시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중 반가운 부스들도 몇몇 보였다. 민음사, 책세상, 창작과비평사, 한길사, 범우사, 살림출판사, 세계문학, 휴머니스트, 김영사, 열린책들. ― 우리 앞으로도 잘해 봅시다. 열린책들은 얄팍한 장정(裝幀)으로 가격 장난 그만 치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