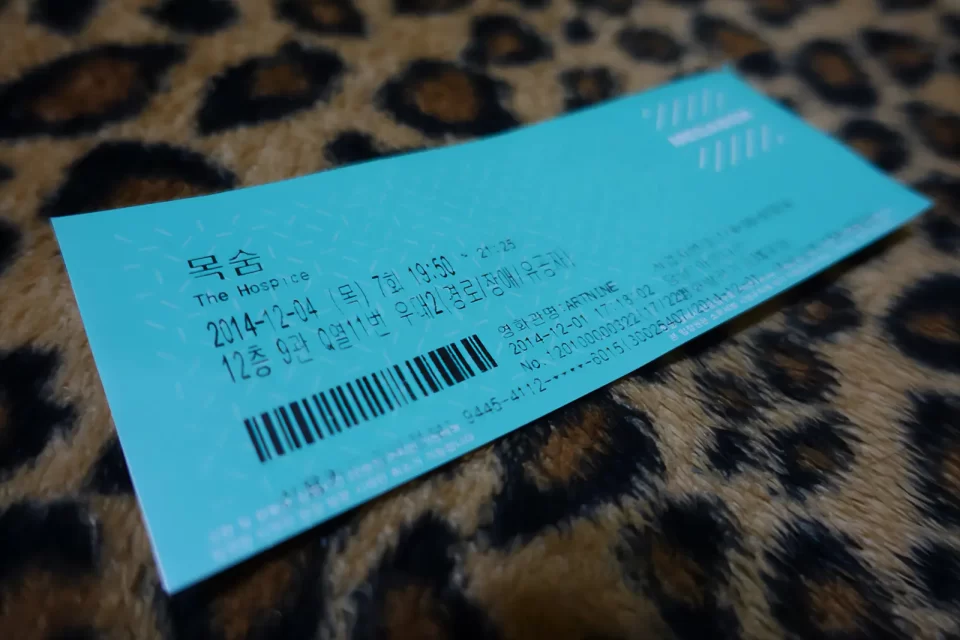여름 내내 문을 닫지 않았다. 그 문으로 열기가 들어왔고 아무것도 나가지 않았다. 나는 내 몸을 돌보는 일에도 힘이 부쳐 베개에 머리만 찧었다. 집 앞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조심스러웠다. 병동을 질러가듯 주춤하다 빠르게 멀어졌다. 나는 다감했던 날들이 끝났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다. 아직 따끈한 별이 뜨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뱉는 말마다 절벽 끝에서 고꾸라지는 것 같았다. 딱딱한 몸을 솜이불 아래에 다시 뉘이고 너와 나의 아득한 사이가 떠오르면 괜히 무안해서 ‘반야심경’을 왰다.
그리고 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