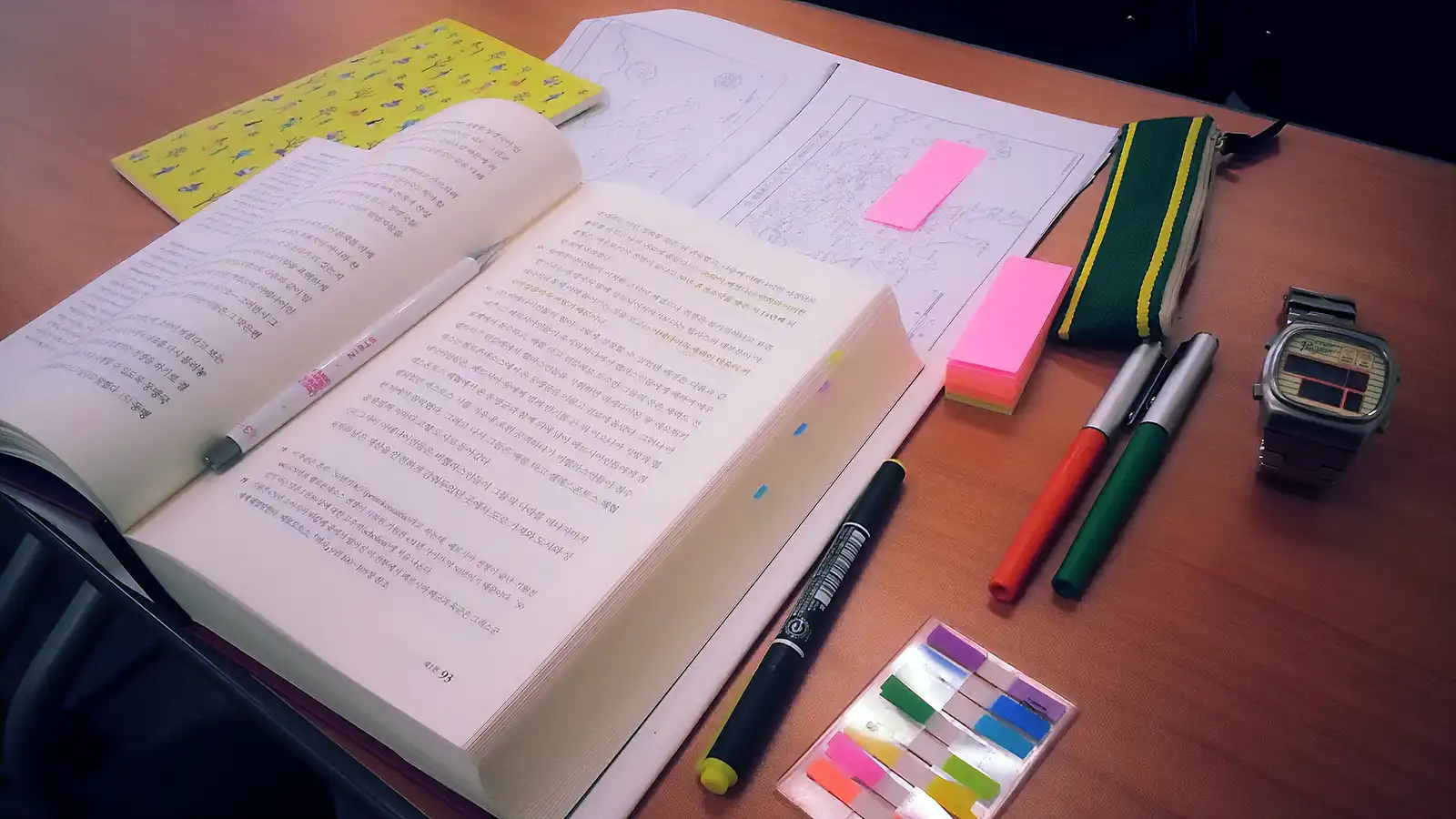8월이 사람들의 미움을 짊어지고 다음 해로 떠나던 날 새벽, 멜랑꼴리한 문자메시지 한 통이 가을바람을 묻힌 채 찾아왔다.
― “가끔 고민해 정리벽이랄까 저장된 번호들을 보면서 이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나 같은 것들”
아득히 먼 마을에서 단문 메시지 80바이트를 꾹꾹 채워 발송한 신호는 너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님을 애도하고 동시에 지금 내 관계를 몽땅 되감아 보도록 지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나는 ㅊ에게 위안이 될 만한 혼잣말을 보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내가 정리되었을까?). 궁색한 생활을 조금 감추며 변명을 남겨두자면, ‘어떤 이유’로 그날 매우 바빴고, 나는 이미 저장된 이에 대해 삭제와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물론 “우리는 정말 우리일까?”라는 의심은 식욕만큼이나 끝이 없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당신을 쉽게 지우지 못한다.
나는 너를 정리하지 못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가혹하지만 일종의 징벌로서 고백한다), 너를 정리하기 위해서 너의 번호를 정리하지 못한다. 네가 불현듯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 않을까 불안해서, 네가 너라는 사실을 잠시 잊은 채 들뜬 기분으로 반기는 게 아닐까 걱정스러워서, 그것을 시작으로 완벽히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이제는 낯설어진 너의 이름이 휴대전화기를 흔들어 가을밤 귀뚜라미를 놀래킨다면, 난 조심스럽게 종료 버튼을 누를 생각이다. 아주 확실한 땅 투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을 생각이다. 연락처의 247명 중 이렇게 슬픈 위치로 저장된 사람은 너 하나다. 너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 아니, 오히려 나는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다.
너는 한때 친구였고 연인이었고 그 이상 애틋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중대한 시점에 할퀴며 돌아서 버린 사람이다. 동시에 나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이다(나의 죄책감은 너를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래서 난 너를 절대 간단히 지워버릴 수 없다. 절멸한 적 없는, 절멸되지 않는, 그래서 진화밖에 남지 않은 감정이 너라는 대상을 초월하여 어느 만큼의 강함과 잔혹함을 온몸에 두를 수 있는지 이해한다면 날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때 우리였을 때 만든 초원이 단숨에 사막이 되어 그곳을 영원히 혼자 횡단해야 하는 나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결코 미워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결국 너의 번호를 지우지 않는다. 너와 나의 ‘애틋’을 애도하며 거기 그냥 둔다. 모든 게 달라졌지만 ‘지난 우리’를 의심하지 않는다. 초원과 사막이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난 잘 알고 있다.
추가. 이 밤에 “안녕 난 247명 중의 하나인 ㅊ씨야ㅡ_ㅡ”라는 문자가 왔다. ‘설마 이 글을 보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안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