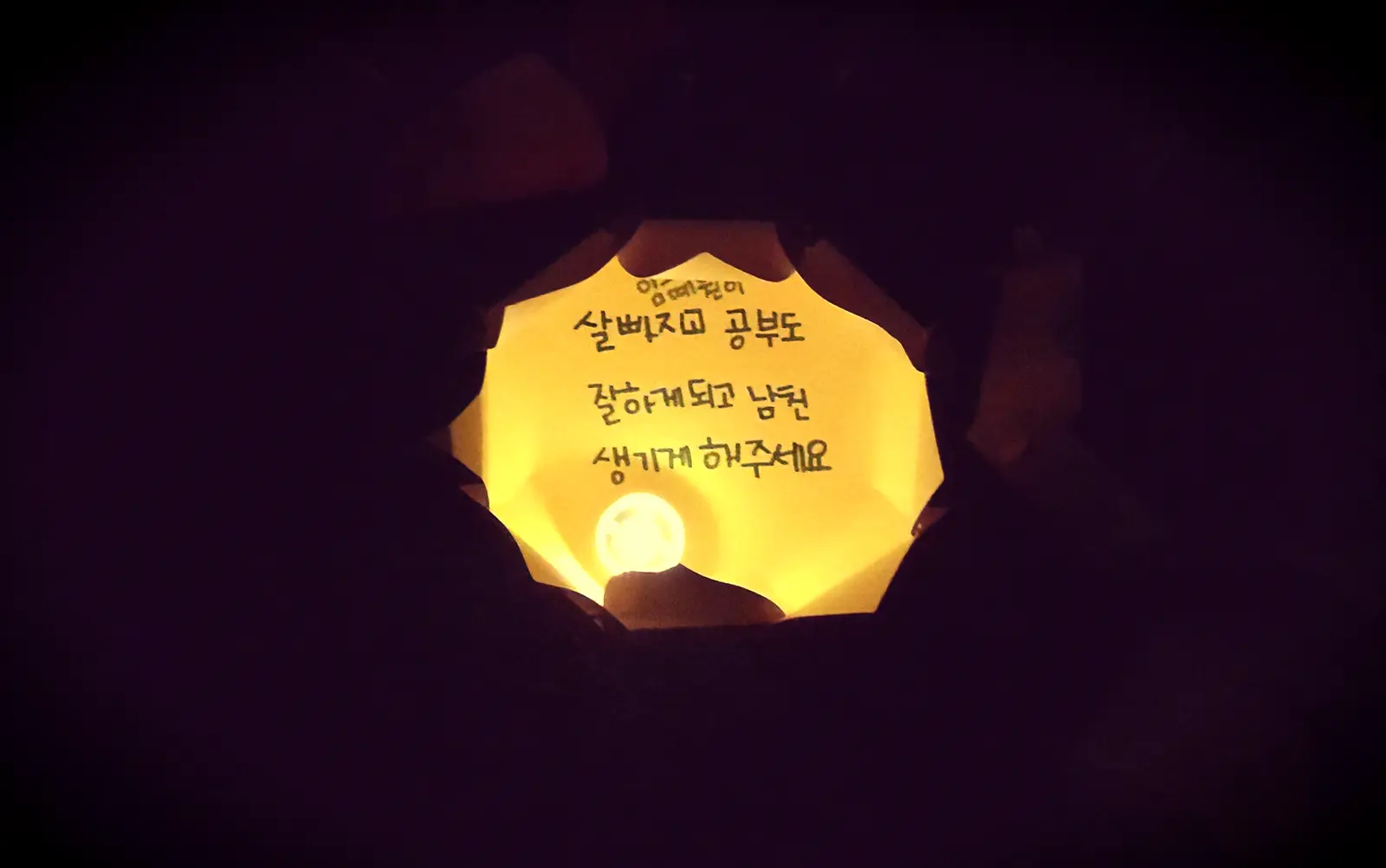그는 다짜고짜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고 그는 엉망으로 취해 있었다.
“너한테는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죽음은 안 보여.”라고 대답했다.
“내 눈앞에는 죽음이 있어. 구부리는 방법을 알아낸 거지.”
나는 “에?”하고 추임새만 넣었다.
“길 위를 달리고 있어, 사람은 죄다. 목적지는 죽음. 그런데 내가 구부리는 방법을 알아냈단 말이지. 휙 구부려서 착 이어붙이면, 불법 유턴 한 번으로 죽음에 도착!”
나는 그 방법이 뭔지 물었다.
“그보다, 난 구부리는 방법을 알아냈고, 구부렸고, 그래서 당장 죽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해.”
나는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핀잔을 했다.
“이제 어떡하면 좋겠냐?”
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타박했다.
“그렇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리지. 나는 이미 구부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곧 죽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알아 두라고. 싫어도 알아둬. 한번 구부러뜨리면 보통사람으로 살 수 없게 돼. 지긋지긋하다.”
나는 그에게 좀 자고 일어나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타일렀다.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넌 그러지 마라. 네 기분은 알지만.”
나는 다시 “에?”하고 추임새를 넣었다. 내 기분 어디에 나만 모르는 굴절이 있는 것일까.
내가 물어볼 새도 없이 그는 끝인사를 했다.
“아주 나중에, 거기는 내가 안내할게.”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아니, 그는 전화가 이미 끊어진 줄 알았고 나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