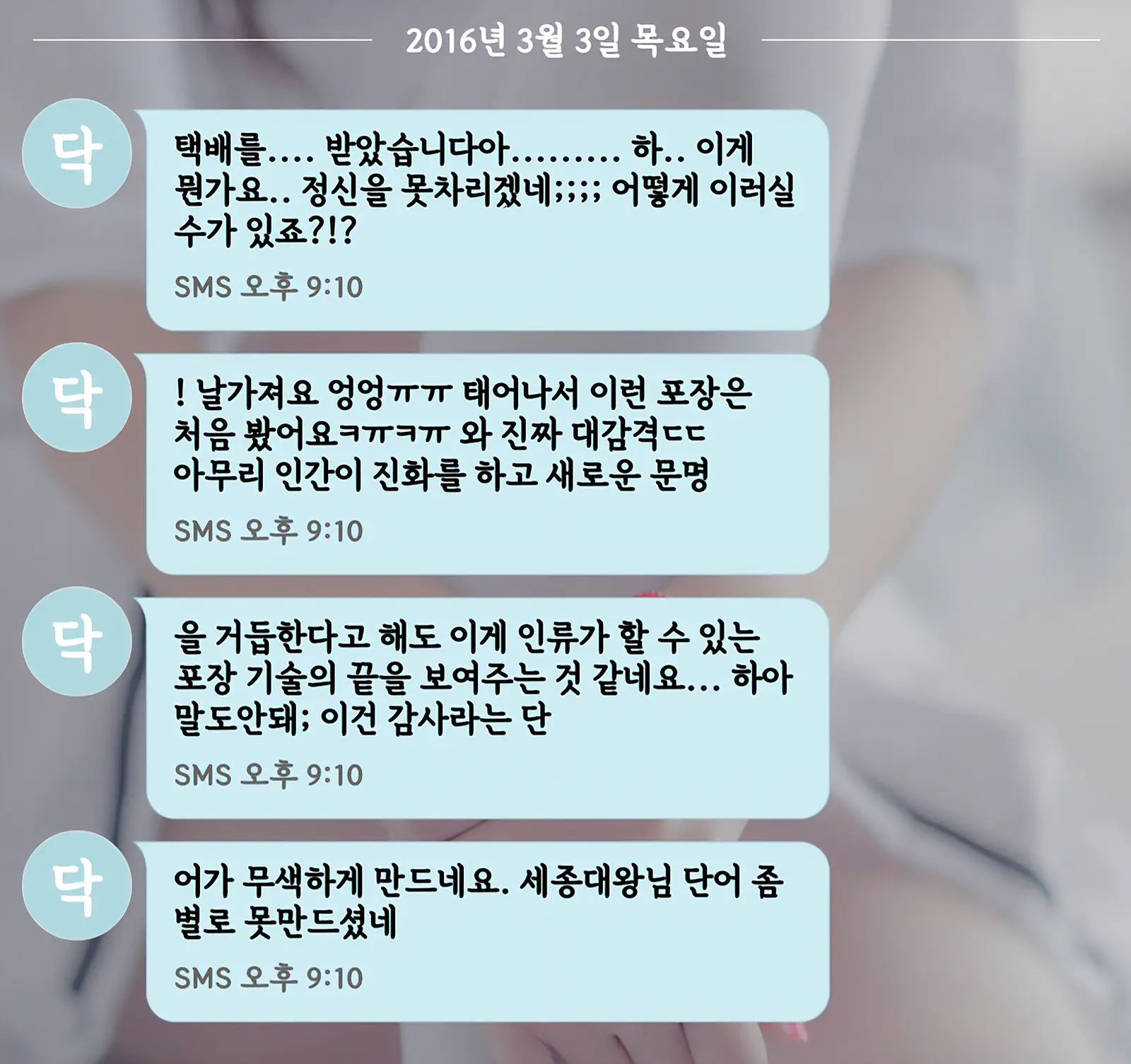어서 죽고 싶다고 읊조리곤 했다. 그러니까 이십 년쯤 줄곧.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에 한 번씩 커터 칼로 팔뚝에 실금을 그으면서 이 얄팍한 쓰라림에 싫증이 나면 곧장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아주 오랫동안 살아있다. 마음 한켠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다. 약한 부모님이 ‘여기’ 없다면 나도 개운하게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는 안다. 모두 거짓이다. 나는 신체기관이 예고 없이 멎어버리기라도 할까 넉넉히 잠을 자고 근면하게 음식을 먹고 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좁고 막힌 곳도 피한다. 그리고 일상적인 기복들, 통증이나 어지러움이나 속쓰림이나 복부팽만감, 심지어 가려움에도 온 신경을 쏟아붓는다. 진도 5.8짜리 지진을 알리는 재난경보보다 더 중요한 무엇처럼.
나는 어쩌다 더는 죽겠다 마음먹지 않는 걸까. 어째서 이렇게까지 삶을 잇고 싶어 하는 걸까. 더 나아질 기미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