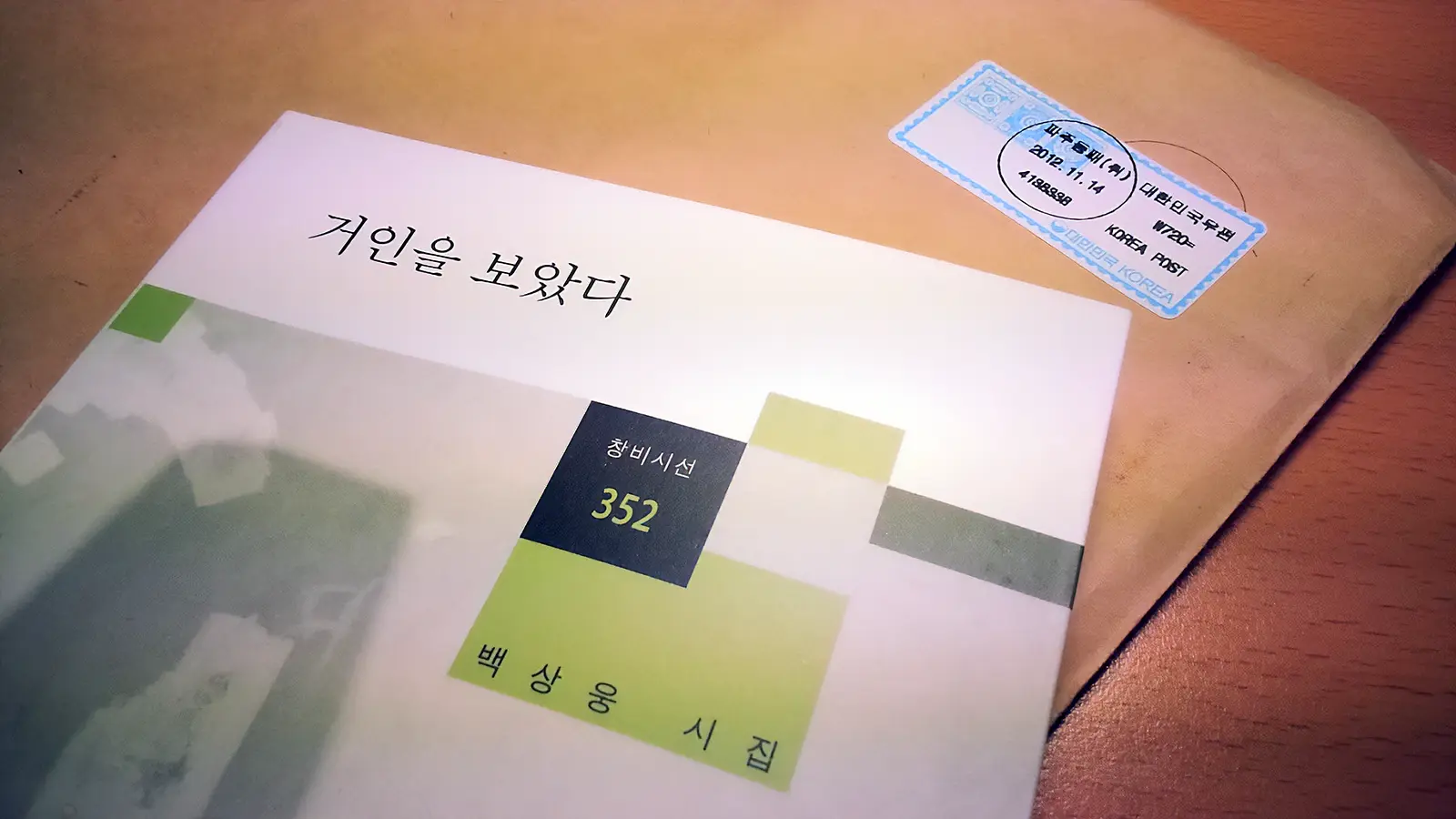줄무늬 라운드 셔츠를 입은 소년이 사거리에 서서 좌우를 둘러보다가 의사총 방향 건널목을 가로지르기 시작한다. 한 쪽 다리가 짧은 꼬마 병정처럼 절뚝이며 걷는다. 중간부터는 폴짝폴짝 뛴다. 나는 건널목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지그재그 달리기를 반복하는 소년의 짙은 그림자를 보면서 나의 지루한 오월과 여름과의 관계를 생각했다.
여름은 머지않았다. 이거 정말 어찌 된 일인지. 나와 그림자, 우리는 빛에 의해 곧 더 선명해질 것이다. 그렇다. 나는 여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개인적으로, 땀과 끈적임은 재밌다. 돌연 재미없어지면 말끔히 씻어내면 된다.
소년이 두 번째 건널목을 무단으로 횡단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첫 번째 건널목 신호등은 이제야 파란색이다. 신호에 걸려 선 자동차는 없다. 잠시 후 군청 방향 건널목에 파란 신호가 켜졌다.
한 여고생이 손에 카네이션 바구니를 들고 흥겹게 날 앞질러 길을 건너갔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뻤다. 다부진 몸도 밝은 마음도 너무 예뻤다,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싶을 만큼. 이 두 가지만 잘 간직한다면 큰 굴곡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부분에서 나는 처참히 실패했고, 아쉽기만 한 삶을 살고 있다. 애초에 갖지 못한 것을 간직할 방법은 없다.
읍내 길가엔 카네이션을 파는 노점 여럿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노점 주인들은 어버이날 제 자녀가 카네이션을 내밀면 ‘어느 집에서 샀느냐?’고 추궁할 게 분명한 값을 내걸고 호객을 했다. 나는 카네이션 딜레마로 곤란을 겪고 있을 카네이션 노점 주인의 자녀를 위해 잠시 기도했다. 그리고 문득,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이었던 반장 아이가 떠올랐다. 그 친구는 어버이 날뿐 아니라 스승의 날에도 아버지의 가슴에 직접 꽃을 달아드렸다. 당시 나는 (멍청하게도) 선생님과 함께 사는 친구를 가끔 걱정했다. 저 깐깐한 데다 대머리인(?) 선생님과 함께 살다니! 계부와 함께 사는 편이 낫지 않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몇몇 친구는 경찰관이나 군인이나 교도관과 동거 중이었다.
한참 내키는 대로 걷다가 꽃을 잘 꺾기보다는 꽃을 잘 가꿀 것처럼 보이는 화원에 들어갔다. 좋든 싫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의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한다, 라는 형식을 꼭 지기 위해서. 알이 둥글지 않으면 닭은 그것을 품지 않는다.
난 꽃집에서 ① 화려하게 꽃꽂이한 카네이션과 ② 단지 화분에 담아놓았을 뿐인 수수한 카네이션을 15분 정도 번갈아 들여다보다가 ② 화분에 담긴 카네이션을 하나 사가지고 나왔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담은 결정이었다. 아무래도 끈기 있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 화려하거나 말거나 일단 살고 볼 일이다.
어린 시절, 나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덜컥 요절하고 싶어 했다. 물론 천재 작가가 된 후에, 운명이 모가지를 덜컥 비틀어버리는 일. 당시 우리는 적당히 재능 있었고 염세적이었다. 하지만 천재는 없었다. 그래도 죽음은 늘 있었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헐렁한 검은 양복을 뒤집어쓴 채 미지근한 육개장을 퍼먹으며 병풍 너머 존재에 관해 3할, 나에 관해 7할을 생각했다. 그리고 요절한 천재작가이기 보다는 정원사가 되겠다고 결정했다. 화려하거나 말거나 일단 살고 볼 일이다. 나는 살아 있어서 너를 보았다. 나는 어떤 형식의 죽음으로도 너를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삶이 애써 베푼 것에 대해선 죽음으로 갚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