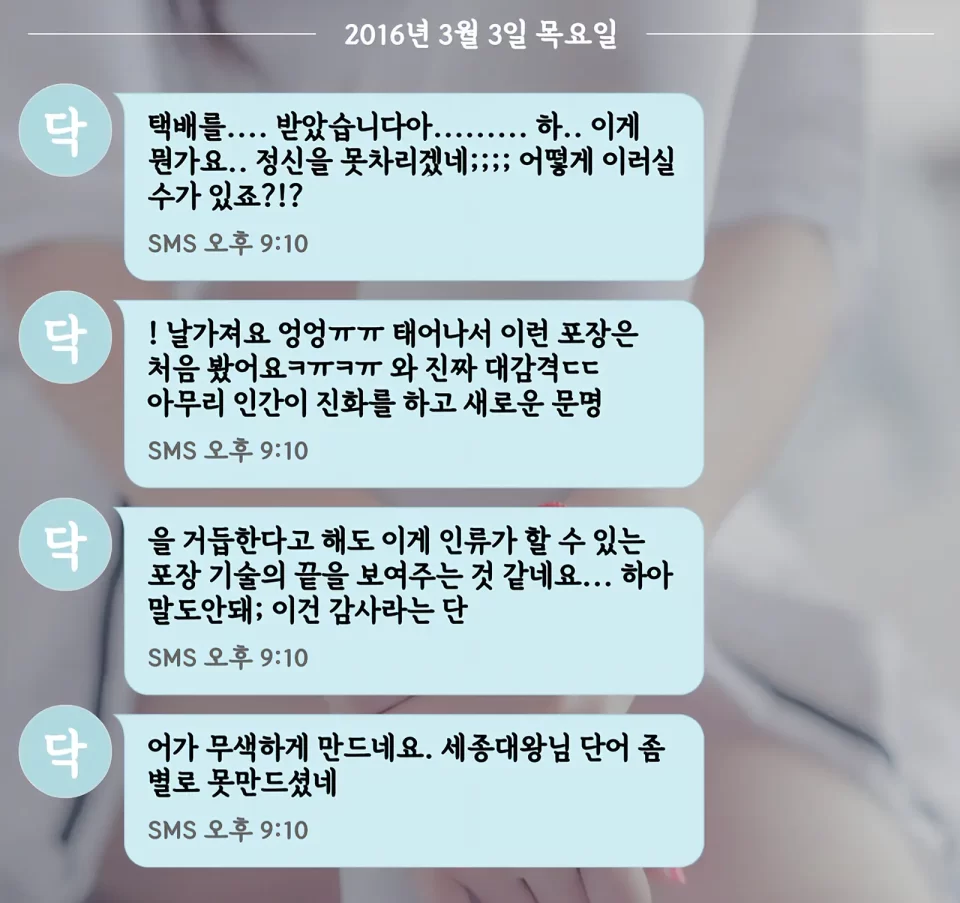어제는 술자리에 있었다. 유쾌했다. 그러나 순결한 즐거움이 들이칠 때마다 질겁했다. 쓸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맞섰다.
수면제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삼킨 어떤 날도 그랬다. 그날 낮에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앞에 두고 알약 반쪽이 잠을 강제하는 이치를 공부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수면제를 삼키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 약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대강 배웠지만 앞으로 내가 감각할 바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수면제가 잠을 끄집어내는 것인지, 배양하는 것인지, 불러들이는 것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의식이 포획되어 쓰러지는 과정이 궁금하고 불안했다. 십여 분 뒤, 두 가지 변화를 감지했다. 의식은 토막이 났고 날숨은 한없이 늘어졌다. 그건 아주 괴이한 기분이었다. 마치 자연사 중인 것 같았다. 그대로 잠들었다면 지금쯤 수면제를 추앙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렴풋한 의식을 옭아 팔다리를 내저었다. 잠은 한 발 물러났다. 잠시 뒤에 잠은 또 은밀히 접근했고 나는 더 탁해진 의식으로 버둥거렸다. 이 힘겨운 대치는 아침나절에야 끝이 났다. 그리고 자력으로 잠에 들어갔다. 다음날, 보름치 수면제를 모두 버렸다. 물리친 잠과 채탐한 잠은 뭔가 같지 않았다.
어젯밤 술자리의 유쾌함도 뭔가 같지 않았다. 순결한 기쁨이 우리 무릎 위에 걸터앉아 짓궂게 간지럽혔지만 내 바 스툴은 자꾸 가라앉는 것 같았다. 나는 품 안의 기쁨을 몰래 재웠다. 그리고 안 주머니의 지갑을 확인하듯 내 영혼 비슷한 것에 섞여 있는 불순물이 잘 있는지 살폈다. 별 대단치도 않은 것인 줄 똑똑히 알면서도, 자꾸 그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