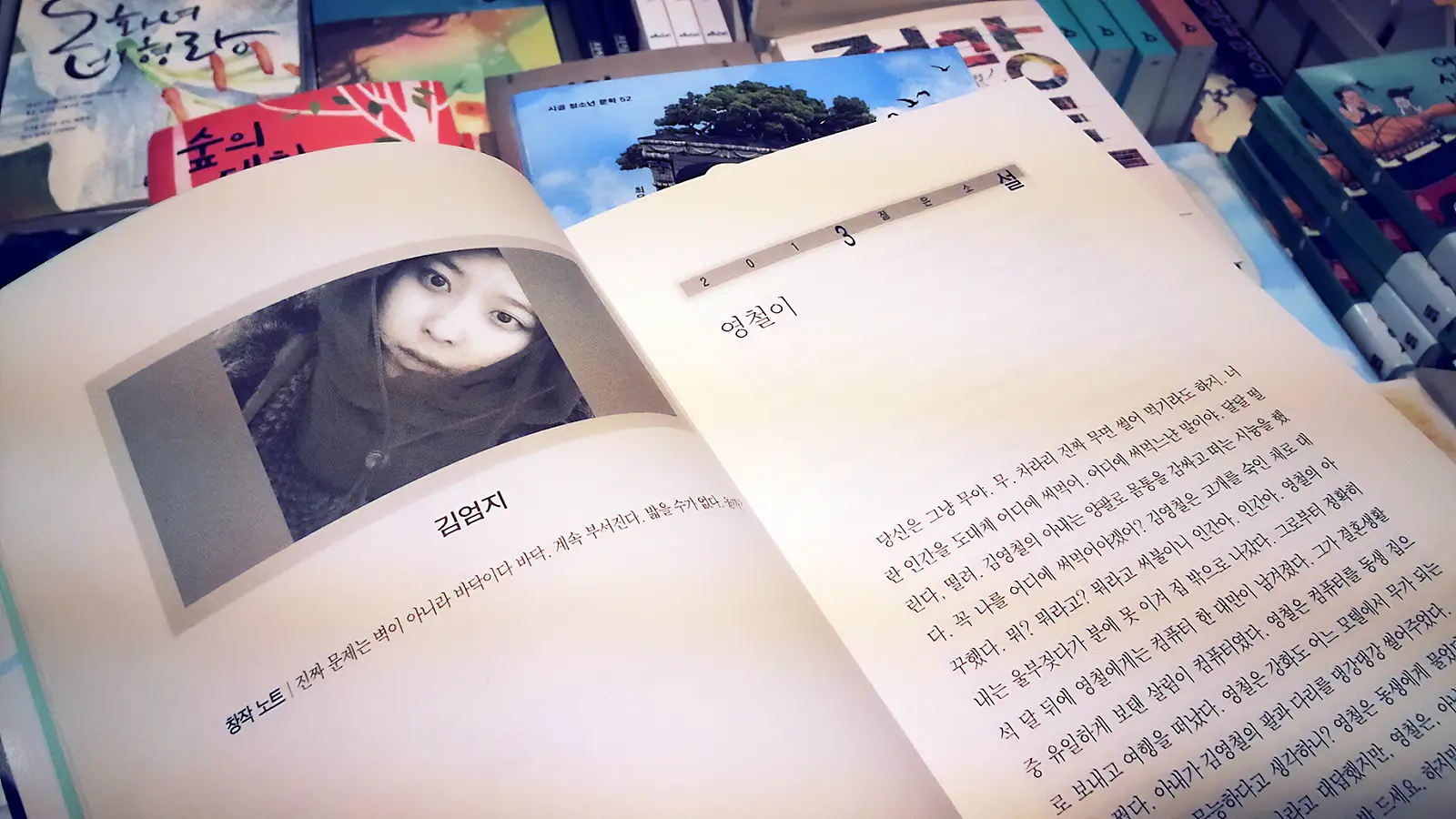귀향 열차 안에서 무가지를 펼쳤다. 무가지답달까, 별 시답잖은 소식이 지면에 빼곡했다. 그러다 반가운 이름이 눈에 띄었는데, 가수 박지윤의 새 앨범 소식이었다. 신보 제목은 《나무가 되는 꿈》이었다. 사실 나는 늘 그녀가 반듯이 자란 나무 모종 같다고 생각해 왔다. 어차피 성장은 시간이 가면서 남긴 상처와 흔적이다. 그런 건 그냥 없어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겠지.
무가지를 꼼꼼하게 읽는 동안, 열차가 영등포역에 들어서는 중이라고 방송이 나왔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지저분한 유리가 나와 풍경 사이에 놓였을 뿐인데 어스름은 목가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열차가 속도를 조금씩 줄이다가 아예 멈춰버리자 어스름의 서정성은 허름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열차 문으로 몰려드는 사람들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다시 무가지에 시선을 뒀다. 「‘이빨로 엉덩이 지압’ 가짜 한의사 실형」이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나는 이 기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창가 자리에 앉으려는 남자를 위해 뻗은 다리를 당겨 고쳐 앉으면서도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요즘도 가끔 소설을 습작한다. 내 소설의 대다수에는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고 저렇다 할 결말도 없다. 그러니 내 소설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다. 이런 ‘용서받지 못할’ 소설을 쓰면서 무가지가 된 나무를 동정한다는 건 확실히 염치없는 일이다. 그나마 나는 내가 욕보인 종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작가 대부분은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있을법하지 않은 사건이 매일 일어나는 세상에서 있을법한 이야기만 쓰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따위의 고민은 과연 불필요한 것일까. 나는 더러운 지압 방법을 상상하고 실행한 무자격 한의사 이모 씨(55)가 남긴 범죄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상하게도 되레 내 소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허구가 아니라 그냥 거짓말처럼.